이중섭! 40년 그 짧은 예술의 삶
섶섬이 보이는 풍경
나무판에 유채, 41×71cm, 1951년
폭격의 위험을 피해 월남한 이중섭은 부산에서 다시 제주도 서귀포로 갔다.
주민의 호의로 살 곳을 얻어서 비로소 안정을 얻게 되었다.
사는 집지붕과 그 아래로 펼쳐지는 섬이 있는 바닷가 고요하고 깨끗한 느낌을 그린 것이 풍경화다.
뒷날 부산과 통영에서 그린 풍경화들에서 보이는 활달한 필치와는 사뭇 다르다.

나무판에 유채, 56×92cm, 1951년 용인 호암 미술관 소장
귤이 자라는 따뜻한 날씨와 작으나마 깃들 수 있는 집에서 비로소 안도한 이중섭의 마음을 느낄수 있다.
아울러 아이가 새를 타는 것으로 설정해서 환상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적인 필치가 있으므로
북한에서 생활할 때 강요되다시피 했던 사실주의적인 태도가 남은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도원>과 함께 이중섭이 남긴 그림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에 속한다.
<도원>과 함께 이중섭이 남긴 그림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에 속한다.

종이에 유채, 65×76cm, 1953년 무렵
물이 있고 크고 작은 봉오리들이 있는 곳에 서있는 천도복숭아를 중심으로
네 명의 남자아이가 노는 광경을 통하여 낙원의 느낌을 나타냈다.
젊은 시절 애인에게 보낸 그림엽서들에도 이런 경향이 강했다.
통영에 머물던 시기에 그려진 것이라고 한다.
최재덕과 8.15 직후 서울에서 그렸던 벽화도 이런 소재였다고 하는데,
통영에서 멀지않은 산청이 고향이며,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월북하고
없었던 조선신미술가협회의 동인이었던 최재덕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호 대향 을 써서 대이상향 이라는 본래의 의미대로 낙원의 느낌을 물씬하게 풍기도록 하였다.

종이에 유채, 29.5×64.5cm, 1954년
헤어져 있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가족을 소달구지에 태우고 자신은
황소를 끌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함께 가는 광경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 그림은 이를 옮긴 것이다. 서울에서 개인전을 성공리에 마치면
곧 만나게 될 가족에 대하여 희망에 차서 그린 것이다.
유화가 1점 더 있다. 그림의 테두리는 젊은 시절 큰 영향을 받은 루오가
쓰던 수법을 응용한 것으로 이중섭도 이를 자주 애용했다.

종이에 유채, 29×40.3cm, 1956년 무렵
소는 중등 과정부터 즐겨 그리던 그림의 소재였다고 동창들은 전한다.
소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소로 상징되는 민족과 현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돌봐준 의사에게 선물한
이 그림은 그의 배려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그림에
보이는 평정한 모습의 소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뒷면에 <비둘기가 있는 가족>이 그려져 있다.

종이에 유채, 29×40.3cm, 1956년 무렵
가족을 그린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경쾌함이다.
가족이란 화기애애함이 넘치는 인간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이 그림은 재빨리 완성해 이런 느낌이 더더욱 강조되었고,
등장인물의 개별 특징이 또렷한 것이 큰 특징이다

종이에 유채, 32.3×49.5cm, 1953년 무렵
소는 고개를 들면서 외치는 듯하다. 왼쪽으로 향한 얼굴과 오른쪽으로
향한 눈이 화면의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듯하다. 외침이 들리 듯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의 얼굴과 목 주위를 유달리 주름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코와 입에 가해진 선연한 붉은 색과 넓은 배경의 붉은
노을을 층지게 하여 이런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그가 태어난 평원군은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이런 감회를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종이에 유채, 29×42cm 과천 국립 현대 미술관 소장
두 마리의 닭이 서로 싸우고자 덤벼드는 설정이다. 푸르고 붉은 빛깔로
그린 닭 부분이 충분히 마른 뒤, 그 위에 덮은 검은 빛깔이 마르기 전에
물감칼로 덮은 물감을 긁어냄으로서 완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응하는 색깔과 태세로 보아 고구려 무덤벽화에 나타나는 색채적,
조형적 특징을 계승한 것이라 보인다.

나무판에 유채, 30×41.7cm, 1954년 무렵 서울 홍익대학교 박물관 소장
회색조의 배경에 검고 흰 붓질로 된 득의의 작품이다. 소의 상태도
평정을 이루어서 심정이 안정된 가운데 최고조의 상태를 보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도판 16과 같은 붓질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검은빛과 흰빛을 아울러 추사체와 같은 붓질을 보이고 있다.
특히 머리와 또리 부분에 그런 표현이 강하다. 사의성 마저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아 서예를 비롯한 전통 예술에 대한 소양을 느낄 수 있다.
장자의 우화에 등장하는 솜씨 좋은 소잡이가 생각나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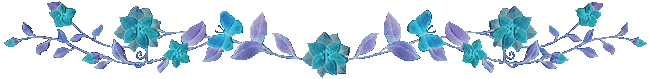
'그림 모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화가 Goto Tatushi의 환상적인 작품 (0) | 2008.05.11 |
|---|---|
| 일본화가 Goto Tatushi의 환상적인 작품 (0) | 2008.05.11 |
| 상상력이 뛰어난 Ben Goossens의 작품세계 (0) | 2008.05.11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0) | 2008.05.11 |
| 해맑은 아이들을 그린 알베르 앙커(Albert Anker)의 작품 (0) | 2008.05.11 |